유럽여행을 하다보면 지역에 따라 물가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남부에서 북부쪽으로 행선지를 옮기면서 그 차이는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다. 숙소가격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데 암스테르담의 호텔가격은 나홀로 여행자에게는 너무 가혹한 수준이다.
어쩔 수없이 열정 가득한 나이때나 경험했던 도미토리 호스텔을 선택해야만 했다.이번에 묵었던 숙소는 암스테르담 여행자들에게는 꽤나 잘 알려진 대형 기숙사형 호스텔. 숙박객 대부분은 대학생 연령대 친구들이었다. 장기여행을 하고 있던 나는 매일 밤마다 세부 도시별 계획을 세워야 했다. 호스텔 카페테리아에서 여행계획을 짜고 있던 나에게 한 남학생이 다가와 얘기한다.
“넌 뭘 그리 심각해? 여기 여행 온 거 아니야? 그냥 즐겨! 여행은 즐기는 거잖아!”
방해받고 싶지 않던 난 “너가 뭔 상관이니?”라는 표정으로 퉁명스럽게 답했지만,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다.
아무리 나름 취재차 유럽대장정에 임하고 있었지만, 결국엔 여행을 온 것을... 빈틈없는 완벽한 여행을 꿈꾸던 나는 진짜 여행의 의미를 잊고 있었던 걸 아닐까라는 후회가 들었다.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운 순간이다.
레고 마을? 오징어 게임 세트장? 여긴 ‘잔담’
암스테르담에서 기차로 15분 정도 달리면 아주 가까운 근교에 레고빌리지 같은 작고 귀여운 마을에 도착한다. 일년내내 이벤트가 벌어질 것 같은 이색적인 도시, ‘잔담’이다. 내가 사랑하는 프랑스 인상파 화가 모네도 이 마을에 매료되어 30여 점이상의 작품을 남겼다고 한다.



잔담역에 내리자 마자 마주하는 ‘인텔 호텔’은 잔담의 랜드마크. 네덜란드 전통가옥 모형을 여러 개로 조합해 호텔 외관을 꾸며놓았다. 레고 블록을 쌓아 올린듯한 독특한 이 호텔은 수많은 여행자들을 잔담으로 이끌고 있는 주역이다. 잔담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이목을 끄는 이 호텔 때문에 여행자들은 초입부터 사진 삼매경에 빠진다. 한참을 감상하다 정신을 차린 나는 잔담 속으로 더 들어가본다.


역시나 잔담 마을을 이루는 네덜란드의 상징인 운하가 마을을 안내한다. 운하 양쪽에는 귀여운 상점들과 초록빛 가로수와 알록달록 꽃으로 꾸며진 브릿지는 첫 인상부터 잔담에 홀려버린 여행자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잔담은 꼭 봐야하는 명소들로 의무감을 주지 않는다. 그냥 편히 쉬다가라는 듯 시선이 닿는 곳마다 어여쁜 풍경을 선물한다.
뉴욕 ‘할렘’의 원조 ‘하를렘’
네덜란드 황금대를 이끈 도시, 하를렘. 암스테르담 중앙역에서 20분 기차를 타고 가면 잔담만큼이나 색다른 도시가 우리를 반긴다. 뉴욕 맨하튼 ‘할렘’가의 이름은 이곳 하를렘에서 이민간 사람들에 의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뉴욕의 할렘가 같은 느낌과는 전혀 다르니 오해하지 말기를^^



하를렘을 방문하면서 내가 가장 기대했던 곳은 하를렘의 중심인 ‘흐로테 마르크트’ 광장에 있는 ‘성 바보 성당’이었다. 이름이 우습긴 하지만 카톨릭 성인 ‘성 바보’를 기리기 위해 100년 넘게 걸려 완성한 성당이다.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와 30m높이의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이다. 헨델과 모차르트가 직접 연주하기도 했던 오르간으로 모차르트는 당시 11살이었다고 한다.
다행히 내가 성당에 도착해서 렌즈를 바꾸는 동안 오르간 연주가 시작되어 세기의 오르간 음률을 들을 수 있었다. 홀리한 느낌을 받으며 성당을 나서고 싶지 않아 한참을 머물러 본다. 헨델과 모차르트가 나를 위해 연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착각과 함께... 성당 밖 광장은 주말 벼룩시장으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그래서 광장의 전경을 사진으로 모두 담을 순 없지만 하를렘 사람들의 삶을 짧게 경험해 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



네덜란드하면 빼놓을 수 없는 ‘풍차!’ 풍차 마을로 유명한 ‘잔세스칸스’ 말고도 소도시마다 풍차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몇몇 있는데 하를렘의 아드리안 풍차’는 그 어느 곳보다 아름답다. 특히 풍차를 배경으로 운하에서 여유있게 보트를 즐기는 사람들과 함께 인상적인 풍경을 연출하고 있어 네덜란드만의 운치있는 분위기를 맘껏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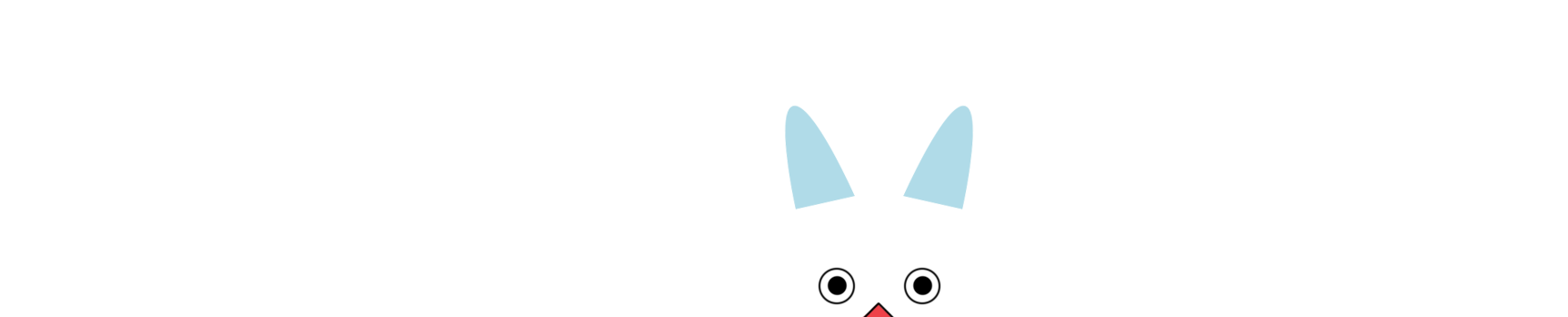







댓글 나누기